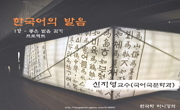日本語と韓国語のグループ討論における相互行為の対���研究 : 일본어와 한국어 그룹토론에서의 상호행위에 관한 대조연구
본 논문은 일본어와 한국어 그룹 토론에서의 상호행위를 분석한 연구이다. 회화 참가자가 어떻게 상호행위를 수행하면서 회화를 만들어나가는가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상호행위의 사회언어학과 회화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상호행위의 규칙성과 토론 프레임을 기술하였다. 상호행위를 회화의 국지적 구조뿐만이 아니라 대국적 구조의 관점까지도 고려하여 회화구조를 분석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상호행위의 방책(strategy)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종래의 상호행위에 관한 연구를 보면 회화의 국지적인 관리시스템인 turn-taking과 관련지어 연구된 것이 대부분이며, 회화의 대국적인 관점에서 상호행위를 체계적이며 실증적으로 연구한 것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화자(話者)간의 발화 교체가 격심하고 변화무쌍한 일상회화 속에서는 상호행위를 통해 회화의 전체상을 도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인식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호행위가 이루는 회화의 국지적 구조뿐만이 아니라 상호행위가 만들어내는 보다 매크로적인 레벨에서의 구조에까지 시야를 넓혀 보면 거기에는 보다 더 큰 회화의 구조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회화의 국지적인 구조와 대국적인 구조 양면에서 상호행위를 이해하고, 회화 구조를 만드는 요소를 추출하였다. 또 상호행위를 수행할 때 어떻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는가와 같은, 회화 방책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은 통계적 처리가 가능한 정량(定量)적 분석법을 이용하고, 일반적인 경향성에서 벗어난 특징은 정성(定性)적인 분석법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논문 전반에 사용된 연구 방법은 우사미(宇佐美1999)의 언어사회심리학적 어프로치를 근간으로 하였다. 단 우사미(1997,2003,2007)의 문자화 및 코딩방법은 2인 회화에는 적합하나 본 연구와 같은 4인 회화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채록한 4인 회화 데이터를 문자화하기 위해 본 연구 독자적인 문자화 원칙, 즉 ‘다인수회화의 문자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문자화 시스템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문자화와 코딩이 어렵다고 인식되어온 3인 이상의 화자가 참여한 회화도 문자화와 코딩화가 용이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해진다.
제 4장에서는 turn과 turn-taking을 분석단위로 삼아 회화의 국지적 구조 속에서 상호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해명하였다. Sack et al.(1974)의 연구를 토대로 turn과 turn-taking을 유형화하였다. 특히 ‘끼어들기’라고 하는 언어행동에 초점을 두어 그 유형과 기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turn-taking에 관여하는 turn의 경우 ‘맞장구 발화’의 빈도는 한국어보다 일본어 쪽이 높으며, ‘실질적 발화’만으로 구성된 turn은 일본어보다 한국어 쪽에서 많이 나타났다. 이는 회화에 대한 화자와 청자의 자세가 다르다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한국어의 경우 화자와 청자 간의 역할이 명확한 발화의 교체로 상호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일본어의 경우 청자로서 맞장구를 보내면서 화자와 함께 회화의 흐름을 만들어 가려는 공화(共話)적인 자세로 회화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끼어들기에 의한 turn-taking은 일본어보다 한국어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로써 일본어에서는 자신에게 turn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어에 있어서의 turn이란 자발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획득하는 적극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세 번째로 맞장구 발화에 의한 끼어들기는 일본어에서, 의도적인 끼어들기는 한국어에서 현저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일본어의 경우 화자가 현행화제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목적으로 끼어들기를 실행하는 일은 매우 드문 현상임에 반해, 한국어의 경우 화자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때 의도적 혹은 고의로 끼어들기를 하여 현 화자에게서 적극적으로 turn을 획득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네 번째로 의도적인 끼어들기 유형중 상대방의 face를 위협하는 ‘자기주장형 끼어들기’는 한국어에서 많이 나타났고, ‘상대방 협력형 끼어들기’는 일본어에서 많이 나타났다. 일본어 화자에게서는 상대방의 발화에 끼어들면서까지 자기주장은 하고 싶지 않다는 기분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그 자리의 분위기를 보호하고 상대방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어 화자는 상대방의 발화에 끼어들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 싶다는 기분이 강한 언어행동을 빈번히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
제 5장에서는 우선구조(preference organization)의 관점에서 두 개의 발화로 이루어지는 인접쌍(adjacency pairs) 중에서 제2발화인 ‘부동의’표현에 초점을 두어 화자간의 상호행위를 분석하였다. 또한 Brown&Levinson(1987)의 face와 FTA(FTA:Face-Threatening Act, face침해행동)의 개념을 이용하여 FTA를 근간으로 성립되는 부동의 표현을 ‘화자의 심리적 태도’와 ‘화자의 발화내용에 대한 확신도’를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명시적인 부동의표현’은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와 화자의 발화내용에 대한 확신도에 따라 face침해의 정도를 강화시키는 ‘비난・반감의 표현’, face침해의 정도를 완화시키는 ‘비단언적인 표현’, 그리고 face침해의 정도를 완화 혹은 강화시키는 언어표지가 없는 ‘단언적인 표현’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face침해 정도가 가장 강한 ‘비난・반감의 표현’은 비난이나 아이러니, 부정(否定)의 응답사가 대표적이며, 보통 문말(文末)을 강조하는 억양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반감의 기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비난・반감의 표현’은 일본어보다 한국어 쪽에서 다용되고 있다. ‘비단언적인 표현’은 화자자신의 정보나 지식, 판단을 단언하지 않고 불확실한 것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이나 동의를 구하는 표현이 대표적이며, 이는 한국어보다 일본어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두 번째로 ‘비명시적인 부동의 표현’은 상대방의 반응이 동의인지 부동의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이가 부동의인지에 대한 판단은 의견 제안자에게 위임된다. 즉, 제안자가 상대방의 반응을 부동의라고 감지하여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취하함으로써 비로소 부동의임이 판명된다. 세 번째로 ‘명시적인 부동의표현’은 한국어, 일본어 모두에서 출현율이 낮았다. 상대방의 face를 배려하지 않는 부동의 표현은 화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정확히, 혹은 직설적으로 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이다. 문(文)을 끝까지 단언하는 형식이 많으며, 단정・주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표현은 화자가 청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는 명료해지나 노골적으로 청자의 face를 침범하는 행위가 되므로 face침해 정도는 커진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face를 배려한 부동의 표현은 화자가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의 기분을 완화하여 상대방에게 부동의를 전하는 표현으로, 주로 문말까지 정확히 말하지 않고 도중에 그만두는 표현, 화자의 판단을 불확실한 것으로 애매하게 얼버무리거나 화자가 내린 판단의 옳고 그름을 청자에게 확인하는 표현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표현은 청자에게 무리하게 강요하지 않는, 상대방의 positive face를 존중하는 방책의 하나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제 6장에서는 화제전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에 나타나는 상호 행위를 고찰하였다. 인접쌍의 확장으로 이루어지는 복수(複數)의 발화의 내용적 집합체인 ‘화제(話題)’라는 단위에 초점을 두어 선행화제에서 후속화제로의 이행을 원활이 해주는 장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한 덩어리의 화제를 ‘개시부’‘전개부’‘종료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선행화제의 종료부와 후속화제의 개시부에 나타나는 화제전환표현은 선행화제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원활히 다음 화제로 이행시켜주는 쿠션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단, 화제개시부의 ‘화제 그 자체를 제시하는 표현’에 의한 화제전환에는 이와 같은 기능은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로 선행화제의 종료부에 나타나는 언어적인 화제전환표현은 선도(先導)발화인 ‘화제종료를 시사하는 표현’과 응답(應答)발화인 ‘맞장구(あいづち) 발화’의 교환으로 나타난다. ‘화제종료를 시사하는 표현’은 현 화제를 명시적으로 종결시켜 의미적으로 결속성을 가진 화제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맞장구 발화’는 선도발화에 대해 동의나 이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화제종료를 시사하는 표현’와 ‘맞장구 발화’가 한 쌍을 이룸으로써 화제전환이 보다 원활해진다. 세 번째로 선행화제의 종료부에 나타나는 화제전환표현을 보면 일본어의 경우 ‘맞장구 발화’의 출현율이 ‘화제종료를 시사하는 표현’보다 약간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데 반해, 한국어에서는 ‘화제종료를 시사하는 표현’이‘맞장구 발화’보다 약 2배 가까운 비율로 나타났다. 이로써 일본어 화자 쪽이 한국어 화자보다 화자간의 충분한 상호이해를 얻어 협조적으로 화제를 마무리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네 번째로 후속화제의 개시부에 보이는 화제전환표현에는 ‘화제개시 시사표현’‘주의환기 표현’‘화제 그 자체의 제시’가 있다. ‘화제개시 시사표현’과 ‘주의환기 표현’은 화제개시를 암시하는 신호가 있음에 반해 ‘화제 그 자체의 제시’의 경우 화제개시를 나타내는 신호없이 갑자기 신화제가 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자간의 긴밀한 상호이해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로 후속화제의 개시부에 보이는 화제전환표현을 보면 일본과 한국어 모두 ‘화제개시 시사표현’의 출현율이 가장 높다. 신 화제를 제시할 때에는 화제전환을 나타내는 표지로써 선행화제와 구별짓는 것이 화제전환 개시부에 있어서의 발화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어의 경우 ‘화제 그 자체의 제시’에 의해 화제전환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화제 개시부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있지 않더라도 화제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일본어 화자간에서는 이미 토론의 프레임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제 7장에서는 화제의 구조와 화제전환에 있어서의 상호행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 덩어리의 화제를 구조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화제를 성립하게 하는 구성요소와 그 기능, 화제 구조 양식, 화제전환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인접한 두 개의 화제의 전환양식을 후속화제의 출현위치에 따라 ‘종료전환형’‘끼어들기 전환형’으로 분류하고, 이것이 회화의 흐름에 작용하는 기능과 상호행위의 양상을 대국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한국어, 일본어 모두 개시부, 전개부, 종료부가 모두 갖춰진 형태의 화제가 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종료부가 결여된 형태의 화제는 출현율은 일본어보다 한국어 쪽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일본어보다 한국어 쪽이 한창 화제가 전개되고 있는 도중에 회화가 단절되어 다음 화제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화제전환의 유형에는 후속화제의 출현위치에 따라 ‘종료전환형’‘끼어들기 전환형’으로 나눌 수 있다. ‘종료전환형’은 선행화제의 종료부가 제시된 후 후속화제가 개시되는 것으로, 원활한 화제전환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끼어들기 전환형’은 후속화제의 개시자가 자신의 발화를 끼워 넣는 타이밍을 잘못 판단하여 끼어들기를 하는 것으로 후속화제로의 원활한 전환을 방해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화제전환의 기본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회화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려고 하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일본어 모두 ‘종료전환형’의 출현율이 ‘끼어들기 전환형’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로써 ‘종료전환형’이 화제전환의 기본 모델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끼어들기 전환형’의 출현율이 일본어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로써 한국어 화자 쪽이 일본어 화자보다 현 화제가 끝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화제를 제시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적극적으로 회화에 참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본 논문은 일본과 한국 두 언어문화가 가지는 그룹토론에서의 프레임의 구조와 상호행위를 해명하기 위해 회화의 국지적인 구조뿐만이 아니라 대국적인 구조 모두를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회화 구조적인 측면과 더불어 대인배려행동(對人配慮行動) 관점에서도 상호행위를 연구하여 일본과 한국의 토론의 프레임의 차이를 해명하였다. 특히 회화의 대국적인 구조 즉 화제구조의 연구에 있어서 정량적 분석 방법을 시도한 것은 화제(話題)의 연구에 있어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겠다. 연구 방법상에 있어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다인수회화의 문자화 시스템’을 고안한 것도 3인 이상의 화자에 의한 회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앞으로 회화에 있어서의 언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요소까지도 분석하고 삽입발화연속(揷入發話連續)이나 발화교환(發話交換)구조와 같은 다양한 분석 툴을 이용함으로써 상호행위의 메카니즘을 보다 다각적이고 면밀히 연구해 보고자 한다.
- 1 序論 1
- 1.1 硏究の背景 1
- 1.2 硏究目的 5
- 1.3 先行硏究 8
- 1.4 本硏究の方向性 26
- 1.5 本論文の構成 27
- 2 硏究方法 30
- 2.1 言語社會心理學的アプローチ 30
- 2.2 實驗計劃 31
- 2.3 會話の收錄 33
- 2.4 文字化 37
- 3 會話の分析單位とコーディング 51
- 3.1 會話分析における分析單位 51
- 3.2 本硏究における分析單位の設定 56
- 3.3 コーディング方法 61
- 3.4 分析單位の一致率 66
- 3.5 文字化データの構築量 68
- 4 turnとturn-takingの展開における相互行爲 70
- 4.1 硏究目的 70
- 4.2 turnの定義と類型 71
- 4.3 turn-takingの定義と類型 72
- 4.4 分析結果と考察 82
- 4.5 まとめ 96
- 5 不同意表現における相互行爲 98
- 5.1 硏究目的 98
- 5.2 不同意の定義 99
- 5.3 不同意表現の同定 98
- 5.4 不同意表現の類型 101
- 5.5 日本語と韓國語における不同意の對照 118
- 5.6 まとめ 120
- 6 話題轉換表現における相互行爲 123
- 6.1 硏究目的 123
- 6.2 話題の定義 123
- 6.3 話題の構成要素 124
- 6.4 話題轉換を表す表現 126
- 6.5 日本語と韓國語の話題轉換表現の對照 137
- 6.6 まとめ 141
- 7 話題の構造と話題轉換における相互行爲 144
- 7.1 硏究目的 144
- 7.2 話題の構造と成り立ち 145
- 7.3 日本語と韓國語における話題の構造の在り方の對照 148
- 7.4 話題轉換の類型 150
- 7.5 日本語と韓國語における話題轉換の類型の對照 156
- 7.6 まとめ 159
- 8 結論 161
- 8.1 全體のまとめ 161
- 8.2 本硏究の意義 168
- 8.3 今後の課題 169
- 參考文獻 171
- 各章と旣發表論文との關係 187
- 抄錄 188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
-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
제 6 조 (이용신청)
-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 ② 비밀번호
-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
-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
제 18 조 (이용요금)
-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
-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
-
제 6 장 저작권
-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RISS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RISS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RISS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RISS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1. 31.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